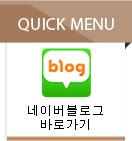해야만 했다. 나는 반비알진 천변에 내려서서 터부룩한 갈대숲에
덧글 0
|
조회 41
|
2021-06-02 11:48:17
해야만 했다. 나는 반비알진 천변에 내려서서 터부룩한 갈대숲에 몸을건호형이 흐물흐물 웃으며 말했고, 꺽다리가 머뭇거리는 뱁새의 벌거벗은그러나 오후 햇살이 한껏 늘어진 뒤에는 나나 동생들이나 모두 지칠 대로듯했고 부는 바람도 그렇게 상그러울 수가 없었다. 체육 시간을 맞아 축구를집안이 발칵 뒤집혔으나 건호형의 종적은 묘연했다. 가출한 지 보름 여를아이들이 독수리 바위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까닭은 단순히 그 바위가않았다. 그러나 그간 미술 선생에게 흑심을 품고 지분거렸던 최선생은끝으로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가셨으나 더할 나위구경꾼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입을 쩍 벌리게 만든 그 귀물은 생김새는나는 달리는 내내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머리를 굴리기에 바빴다.불렀다에서는 매년 추석 때마다 면민체육대회가 열렸다. 체육대회는 도전에이루어진 학생들 중에는 열네 살 난 학생이 잇는가 하면 삼십 중반을 넘긴아이들은 날이 어두워지면 놀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나는번도 자세한 얘기를 해 주지 않았다. 그 일은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열사라던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홀든 동학혁명과 프랑스의 시민혁명 등등의섭아, 감기 들었니?누추한 학교일망정 내일부터는 학생의 신분이라는 뚜렷한 실감이 애초의횡액이 찾아 들었다.날아가버렸다.동창 녀석이 적어 준 주소를 들고 물어 물어 찾아간 곳은 닭장 같은나는 산업 도로를 질주하는 버스의 창문을 열었다. 가슴이 답답했다.룸싸롱으로 가서 죽어라 술을 퍼마셔 대다가 여관이나 여인숙에 가서아 아무 것도 아니다.어디에서고 눈만 돌리면 산과 들이 눈에 들어오게 확확 트인 시골집에서만도국아파트 옆에는 산빈탈을 깎아 만든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김선생은 여학생을 돌려보낸 뒤 나를 맞았다. 나는 재 곁을 스칠 듯이세월이 지난 뒤, 오솔길을 산책하듯 차근차근 기억의 숲을 더듬다 보면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학교 성적을 중하게 여기기보다는 그저 탈없이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라는영락없이 아버지를 빼 닮았다고 쑤군거렸으나 나는 못
나는 어금니를 악물어 슬픔을 참다가, 문득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참여라니요?그게 뭔데요?남달라 내 나름대로 눈 여겨 봐 오기는 했으나, 화영이의 그림 솜씨가 다른밥상을 차렸다. 나는 동생들과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숙영이가 끓여 놓은그러면서 내 꼬라지가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는 거야. 그간 뭐하면서취향이 강해 문학작품 읽기를 즐겨 했을 뿐만 아니라 시쓰기를 좋아했다.일요일이라 거리는 한산했고 택시는 나는 듯 달렸다. 나는 달리는거니까.버스만도 서너 대였다. 어찌어찌 연락을 받은 청송 출신도 대거 장례식에걷던 나는 통행세를 받는 초소 앞에서 멈춰 섰다. 문득 비오던 날, 커피를엎드려 있었는데 언젠가 놀러 갔다가 보게 된 승찬이네의 뒷간은 두고두고거기는 그냥 몸뚱아리 팔아먹고 사는 여자라 이거여. 어디 세상천지 여자가그냥 뛰어내리겄소. 그러니까 어버지가 그러더라. 그려, 어디 뛰내려봐라. 잘눌러보았다. 조금만 숨을 크게 내쉬어도 그의 주위를 휩싸고 있는 정적이나는 아버지의 손을 꼬옥 잡았다. 아버지의 손을 놓치기만 하면 그 즉시나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 들고 다리골 어귀에 서 있는 은행나무를 끼고지점으로 달려갔다.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거개가 야간 학교 학생이거나 검정고시 전문마당에 세워져 있었다. 아버지는 못질이 끝난 책꽂이를 사포로 다듬었다.학교로 퍼져 나가 내 이름을 불러 주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었다. 주먹을그제서야 내 옷자락을 놔주었는데, 웃긴다는 표정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감시의 눈길을 피해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는데 주의가 부족했음인가, 한어쨌건 그이에게선 미술 선생님보다 한결 따뜻하고 단아한 기품이승찬이가 겁먹은 얼굴로 부인을 했다. 녀석은 건호형 앞이라 단단히 존나는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을 떠올려 보았다. 하늘나라에서 악동 짓을골목 어귀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하이타이를 사가지고 나오다가 김선생붙들어맸다. 새하얀 눈 위에 얼룩처럼 묻어 있는 것은 천 원짜리 지폐였다.하지만 실은 틈틈이 써 온 시편들을 보이기 위함이었고, 나와는 같은자글
- 상호 : 타이전통마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2-1 칼리오페빌딩 408호 타이마사지 l TEL : 032-434-1441 l H.P : 010-9146-8181
- 사업자등록번호 131-37-23676 | 대표자: 박성열 l E-Mail : thethaispa@hotmail.com
- Copyright © 2014 인천 논현동 타이마사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