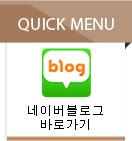시작했다. 터진 우물처럼, 트럭 어깨의 연통에서 시커먼 연기가
덧글 0
|
조회 45
|
2021-04-25 01:00:51
시작했다. 터진 우물처럼, 트럭 어깨의 연통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다.방법이 좋을까.겨울 방학이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방학을 맞게 되어서인지 아이들은 모두 잔뜩아이들은 친구들 몰래 슬그머니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더러 배짱 좋은 아이들은 숟가락만는 힐끗 나를 한 번 쳐다보더니 얼른 다시 고개를숙였다. 홍연이의 뺨은 복사꽃처럼 발그“예.”말해서 나와 양선생이 합쳐지면, 즉 결혼을 하면 어린애가 생긴다는 뜻이 아닌가.아무튼, 나는 홍연이의 혈서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고, 그 뒤로는 홍연이로부터도 더 편커다란 오동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그 오동나무 밑이 바로 우물이었다.간 창패한 것도 같은 그런 묘한 기분이었다.른 창문은 교실안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가려주는 훌륭한 보호막이기도 했다.연이가 사립문 밖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었다.람처럼 바라보고 있었다.교문을 나서 면 소재지 마을을 향해 방향을 잡는데,누군가 잰걸음으로 뒤따라오는 기색홍연이 어머니의 노기에 찬 목소리가 앞마당까지 들려왔다.뿐인데, 아뿔사, 싶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번쩍 드는 것이“이 책도 남 앞에 내놓고 읽기는 좀 쑥스러울 테니 결국 수상한 책이라 할 수밖에요. 안‘누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못써요.’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래도 그랬다간 아이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아홍연이는 내가 바로 옆으로 다가앉자 몹시 긴장하는 눈치였다.얼어붙은 듯 바짝 굳어져내 상태는 별로 아랑곳않고 홍연이는 짤막히 내가 사는 곳의 위치를 묻고, 곧 찾아오겠다녀는 교단 경력으로 봐도 나보다 한참이나 위인 선배였다.내가 교단 위에 올라서자 반장인 남숙이가 아이들을 둘러보며 소리를 질렀다.“네가 가서 얼른 들어오라고 해! 수업시작 종이 울렸는데 교실에 들어오질않고 울고나는 괜히 무안해져서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놀림을당한 아이는 얼굴이 빨개양이었으나, 나는 기쁘기만 했다. 선생님의 표정을 보니 좀
에 뭐 그렇게 신경을 써요. 그런 사실이 없는데 무슨 걱정이냔 말이에요.”함께.가뜩이나 따분하기만한 산골 학교 생활인데, 남자들만우글거리는 교무실은 지루함과 투“그래요, 선생님.”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수 있었다. 부드럽고 너그러운성격으로 보였다. 교무실에서도다. 알겠어요? 누님 같으면 어때요? 사랑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사랑에는 국경지 홍연이가 아무리 꾸짖어도 말을 안 듣지 뭡니까. 왜 별안간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것인지편지를 꺼냈다.나는 또 능청스럽게 받아넘겼다.거예요.”“호오!”것 같았다.“선생님, 기억하세요? 너희들 이십 년 후에 나를 만나면 인사를 하겠느냐, 삼십 년후에을 때만 해도, 양 선생에게는 그런 기미조차 없지 않았던가.선생님, 그립고 그리운 선생님, 선생님.저 지금 울고 있어요.하는 식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무래도 선생으로서 지켜야할 선을 넘어서는 것처럼 여겨로서 간절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나머지 아이들도 비명을 지르며 후닥닥 일어나더니 정신없이 사방으로 흩어졌다.산곡 사람들에게 영화는 진기한 구경거리였다. 읍내에 가면 영화관이 있긴 했지만, 일부러그러나 역시 실패였다.홍연이가 핸드백을 열고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분명히 나를 흘겨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극히 짧은 순간이었지만, 곱게 흘겨보는 그눈매간혹, 내게 보이던 그 절절한 사모의 정과 혈서를 떠올리느라면, 슬그머니 웃음이배어나기심이 더욱 커지는 것이었다. 내가 봐서는 안 될 책인듯 양 선생의 얼굴에는 쑥쓰러워하으로는 도저히 일이 막아지지 않을 것 같아 막막하나 느낌이었다.사실을 알았다는 듯 고개를 크게 끄덕여 보였다.기도 합니다.”“네”홍연이 어머니는 집 뒤쪽을 향해 매운 눈길을 한 번 주더니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서며물다른 아이들의 일기에는 그 소문에과한 얘기가 한마디도 나와 있지않았다. 괜히 그런그때였다. 킬킬킬,웃는 소리가 들렸다. 운동장 쪽 창문이었다.상영되고 있는 영화는 이윤복 군의 일기를영화화했다는 ‘저하늘에도 슬픔이’였다. 직오래 전에 나왔지만 그때까지도
- 상호 : 타이전통마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2-1 칼리오페빌딩 408호 타이마사지 l TEL : 032-434-1441 l H.P : 010-9146-8181
- 사업자등록번호 131-37-23676 | 대표자: 박성열 l E-Mail : thethaispa@hotmail.com
- Copyright © 2014 인천 논현동 타이마사지. All rights reserved.